[이 주의 시사맥(脈)] 챗지피티(chatGPT)
골치 아픈 업무나 과제를 누군가 대신해준다면 어떨까요? 과거엔 희망 사항에 그쳤지만, 이젠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요. 인공지능(AI) 챗봇 ‘챗지피티’(chatGPT) 이야깁니다.
챗GPT는 2022년 12월 미국 인공지능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입니다. 질문에 답하고 글쓰기, 코딩, 정보 검색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구글의 AI 알파고, 스캐터랩의 AI 이루다 등 여러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지만, 챗GPT는 기능이 더욱 고도화하고 일반인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챗GPT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대신 써보도록 했는데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챗GPT를 쓰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데 시간을 덜 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챗GPT를 마냥 반가워해도 될까요. 챗GPT의 역기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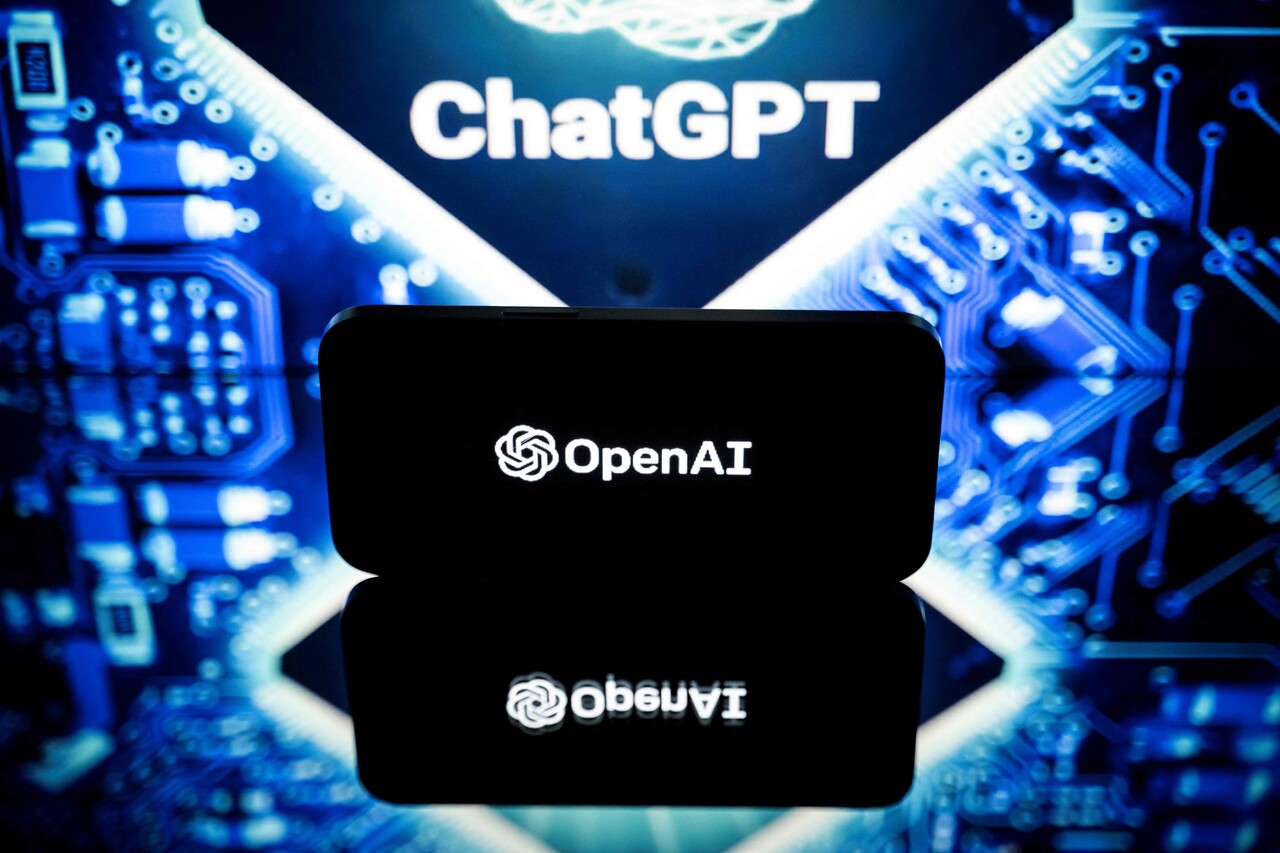
당장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숙제하거나 오픈북(개방형) 시험을 치를 때 챗GPT로 인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미국의 명문 경영전문대학원(MBA)인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졸업 필수시험에서 챗GPT가 B 학점을 받아 합격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AI로 과제나 논문 대필에 도움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자 미국 뉴욕시는 공립학교 내 챗GPT 접속을 차단했고, 국제머신러닝학회(ICML)는 AI를 활용한 과학논문 작성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와튼스쿨의 크리스찬 터비시 교수는 챗GPT를 활용하면 교수와 학생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협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의 커리큘럼 설계와 시험 정책도 이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필 문제가 불거지자 오픈AI는 챗GPT가 만들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낮은 소득을 이유로 부모가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디야 판사는 챗GPT가 초고 작성을 편하게 해줄 뿐, 판사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물어보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챗GPT가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많아졌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챗GPT는 사람들 사이의 무수한 대화를 데이터로 해서 기계학습을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이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그럴싸한 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닐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죠. 챗GPT를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세상에 이미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 고착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챗GPT가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챗GPT에 ‘미국 부시 전 대통령 자택에 보관됐던 기밀문서를 애완견이 삼켰다’는 설정을 입력했더니, 20초 만에 단순 사실을 넘어 관련된 인터뷰, 농담까지 덧붙인 기사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챗GPT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챗GPT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원 콘텐츠 제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사람’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만든 콘텐츠는 현재로선 저작권을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의 홀든 소프 편집장은 “과학 저널의 저자는 작업을 책임진다는 뜻인데, 챗GPT는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공동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챗GPT는 빠르면 이번 달부터 월 20달러 구독료를 부과하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영어로만 서비스되고, 무료인 챗GPT는 전체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었고, 하루 이용자가 약 1300만 명 정도(UBS 추산)인데, 유료 서비스를 쓰면 사용자가 더 많아져도 안정적으로 응답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챗GPT의 등장은 인간에게 호재일까요, 악재가 될까요. AI가 인간의 생활에 깊이 들어올수록,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주의 시사맥(脈), 챗GPT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