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문산책] 안보와 민주주의

18세기 독일은 영방국가(領邦國家)로 갈라져 있었다. 전쟁이라고 해봐야 이권을 놓고 왕의 소규모 군대끼리 다투는 ‘왕들의 전쟁’에 그쳤다. 프랑스 혁명 이후 본격적인 ‘국가 간 전쟁’의 시대가 열린다. 나폴레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반도 장악에 이어 독일 민족의 연합체인 신성로마제국도 해체한다. 그 시기, 칸트는 국가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영구평화론>을 내놓는다. <영구평화론>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공화정, 즉 민중이 다스리는 민주국가를 꿈꾼다. 민주국가 시민은 전쟁하는 정부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주의는 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안보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만이 근거는 아니다. 정치학자 브로스 러셋은 1816~2001년 사이 일어난 2,300개 군사 충돌의 성격을 하나씩 따져봤다. 연구 결과, 관련 국가의 민주주의 점수가 높으면 충돌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주의 점수가 만점인 국가는 평균 점수 국가에 비해 전쟁에 휘말릴 확률이 81%나 낮았다. 안보 증진의 핵심 요소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라는 게 연구의 골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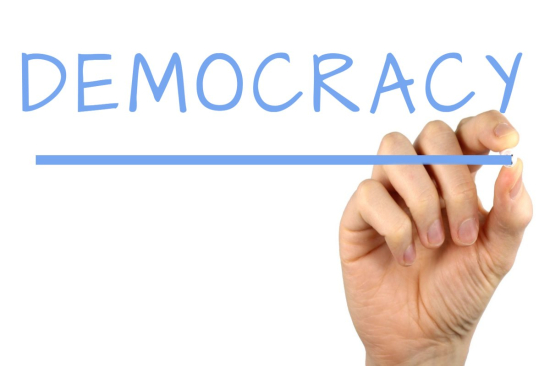
이렇게 보면 비민주적인 북한은 한국 안보의 위험 요소다. 정책의 투명성이 없어 밀실에서 의견이 오가며, 국민의 이익 대신 독재자의 안위만 고려하는 정책 결정 가능성이 커진다. 함경북도에서 일어난 기록적인 홍수로 이재민 14만 명이 발생했지만, 현장 방문도 없이 ‘전쟁의 씨앗’인 핵무장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이 그렇다.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놓기에 독재정권은 쉽게 자신과 이웃 나라의 안보 위험을 가중한다.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북한과의 경제 교류 증가는 ‘차선책’이다. 최선책은 북한의 민주화다. 하지만 급변 사태가 없는 한 북한 정치 체제의 변화를 단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렵다. 칸트 사상에서 국가 간 평화의 선결 조건은 ‘평화의 삼각구도’에 따른 민주주의, 국제기구 참여, 경제교역이다. 북한의 민주화가 어렵다면 UN에 남북이 공동 가입해 있는 현실에서 세 번째 경제 교역만 남는다. 경제 교역 증가는 민주주의를 위한 마중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최소 3천 달러의 국민소득이 필요하다는 헌팅턴의 주장을 적용하면, 경제 교류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가 북한 민주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인 평화 실현 가능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준비 국가들은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한 말이다. 칸트의 ‘충고’ 덕분일까. 선거민주주의라는 조건을 갖춘 국가는 1900년 0개에서 2014년 122개로 증가했다. 전 세계 195개국의 63%에 해당하는 수치다. 북한은 비민주적인 나머지 37% 국가의 하나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증가는 ‘평화의 삼각구도’를 구성하는 한 축인 동시에 민주주의 촉발제다. 틈만 나면 ‘안보’를 외치는 한국 정부가 칸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은 1학기에 [서양문명과 미디어 리터러시], 2학기에 [문명교류와 한국문화]의 인문교양 수업을 개설합니다. 매시간 하나의 역사주제에 대해 김문환 교수가 문명사 강의를 펼칩니다. 수강생은 수업을 듣고 한편의 에세이를 써냅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다 다양한 생각을 곁들여 풀어내는 글입니다. 이 가운데 한편을 골라 지도교수 첨삭 과정을 거쳐 단비뉴스에 <역사인문산책>이란 기획으로 싣습니다. 이 코너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진행되는 [김문환 교수 튜토리얼] 튜티 학생들의 인문 소재 글 한 편도 첨삭 과정을 포함해 실립니다. (편집자) |
편집 : 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