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사전] '인공지능'

인간이 인공지능에 주눅이 들까?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언론이 ‘인공지능이 생산직이나 단순 업무는 대신하지만, 예술가나 전문직 등은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체 가능한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구분하자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걱정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파괴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도 흔히 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넘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쓸모’마저 결정짓는 분위기다.
정작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다. 10년 전 보드리야르는 “디지털화의 운명이 정신세계와 사유 영역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예견했다. 그의 말대로 기술이 진보할수록 ‘대립이 일어나는 민감한 표현도 없을 것’이라면, 다양한 의견이 사라지고 남은 하나의 주장만 진리가 되고 만다. ‘단 하나의 집적회로’가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는 ‘애매함’의 여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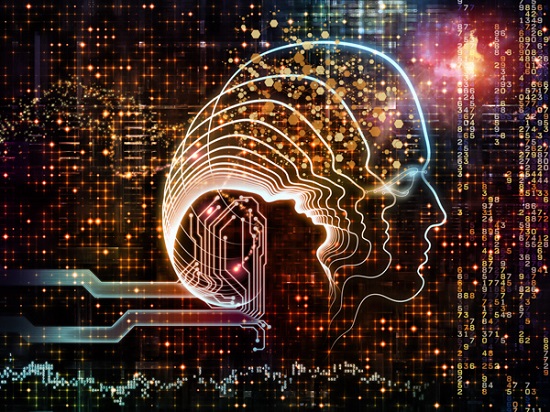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한국 사회와 닮았다. “원래 그래”라는 관습에 얽매어 다른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회를 획일화한다. 그렇게 소수가 만들어지고 ‘약자’의 딱지가 덧붙여진다. 반면 다수 의견은 유일한 진리이자 선이다. 선의 악이나 악의 선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만 알던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둘을 이해할 감수성을 지니게 될까? 이해하지 못하면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는 대상은 악이다.
권력이 선을 차지하면 폭력을 행사한다. 악을 처단한답시고 무자비하게 소수를 짓밟는다. 그래도 선이기에 잘못은 없다. 여론이 나빠지면 약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교묘히 상황을 튼다. 예술사회학자 이라영은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에서 “차별과 박해, 그에 대한 저항은 시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등’이나 ‘분쟁’으로 둔갑한다”고 말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등과 분쟁도 상대와 동등한 위치여야 가능하다. 힘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그 저항은 ‘분쟁’이 아니라 ‘투쟁’이 옳다.
더는 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약자가 제압당하면 안 된다. 세월호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용산 참사 유가족, 밀양 송전탑 농성 주민들은 오랜 시간 박해당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쓸모’는 여기에서 발휘된다. 아무리 효율적인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이라도 한 맺힌 목소리가 그대로 입력되지는 않는다. 반면 민주주의는 소통과 합의의 과정 자체다.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사회의 상태’라고 말했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인간은 인공지능에 주눅 들 필요가 없다.
| |
편집 :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