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흔든 책] 니콜렛 한 니먼 '돼지가 사는 공장'
삼겹살은 구제역과 가격파동에도 여전히 최고의 외식 메뉴다. 삼겹살뿐 아니라 우삼겹, 곱창, 닭똥집까지 고기가 최고라는 인식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고기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직접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아도, 햄, 만두, 소시지 같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는 잘게 갈린 고기가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는 고기를 ‘고기’로만 인식한다. 고기도 한때 살아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식탁에 오르기 전, 살아있는 돼지, 소, 닭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꼬마돼지 베이브>나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봤던 것처럼 푸른 잔디가 깔린 목장과 포근한 헛간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을까?
미국 환경운동가인 니콜렛 한 니먼은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정원에서 채소를 길러 먹으면서 ‘자신의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농장에서 가축과 함께 놀다 보니 그녀도 자연스레 채식주의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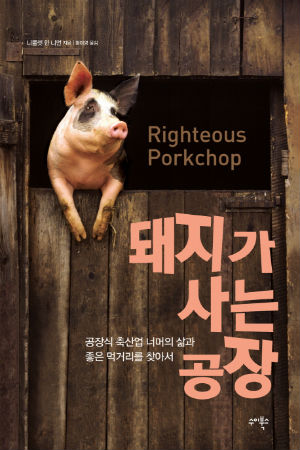
변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자기 고향이 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 로펌에 사표를 던지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환경운동에 투신했다. 그녀는 환경단체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nce)’의 수석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장식 축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 공장식이 아닌 자연식 축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니먼이 쓴 책이 <돼지가 사는 공장>(2012, 수이북스)이다.
철제 우리에서 꼼짝 못 하면서 먹고, 싸고, 자고
“저곳은 농장이 아닙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축산업체의 ‘돼지 창고’를 방문한 환경단체 직원의 말이다. 이제 돼지는 더 이상 농장에 살지 않는다. 안락한 짚북데기 잠자리나 몸을 식힐 진흙탕은커녕, 한 줄로 늘어선 철제구조물이 공장식 축사의 전부다. 철제로 된 축사는 ‘돼지우리’가 아니다. ‘비육장’이라 불린다. 살찔 비(肥)에 기를 육(育)자.
고기를 ‘제조’하기 위해 살 찌우는 게 기르는 목적의 전부다. 비육장 안에서 돼지들은 한 바퀴 돌아서는 동작조차 불가능하다. 꼼짝달싹하기도 힘든 공간에서 돼지들은 주는 대로 먹고, 무릎만 겨우 구부린 채 불편하게 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는 수밖에 할 수 없다. 용변은 갈라진 ‘틈바닥’ 밑으로 떨어져 라군(lagoon)에 모이게 된다. 라군은 가축의 배설물을 모아놓은 거대한 거름 웅덩이다.
‘나는 동물을 자연과 떼어 놓는 게 바로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임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축산업계는 동물들을 땅에서 살게 하는 대신 햇빛과 계절과 날씨와 단절된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 속에 가두어 버린다. 동물을 이해하는 숙련된 일꾼조차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니먼이 책에서 묘사한 공장식 사육은 동물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돼지를 키우는 방식은 철저히 ‘현대화’했다. 사료는 시간에 맞춰 자동 배식되고, 틈바닥에는 물이 흘러 배설물을 쓸어간다.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인공적인 불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한다. 결국 돼지는 자연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공장식 축사 안에서 나고 죽는다. 사육장은 사람 손탈 일 없이 23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 사고로 정전이 돼 환풍기가 꺼지면 자신들의 배설물 냄새에 질식해 죽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런 교미도 허용되지 않고, 새끼 돼지를 낳아도 철창 사이로 겨우 수유하다가 2주 만에 강제로 떨어진다. 그 사이 가위로 꼬리가 싹둑 잘린다. 돼지들이 꼬리를 물어뜯는 습성이 있어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돈업계 주장이다. 젖을 뗀 새끼 돼지들은 락토파민이라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고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발달한다. 움직이지 못한 채 배설물 더미 위에서 지내는 돼지들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사료에 항생제도 첨가한다.
소도 마찬가지다. 역시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살집을 키운다. 풀은커녕, 각종 항생제와 동물의 고기나 내장이 섞인 사료를 먹고, 젖소에게는 강제 임신에 맞춤 호르몬제가 특식으로 주어진다.
이로울 게 없는 공장식 축산업
저자에 따르면 원래 공장식 비육장이 도입된 목적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 쇠고기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초원보다 곡식이나 동물성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게 고기를 보다 저렴하면서도 기름지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고기 수요량을 따라잡기 위해 사육장을 더욱 집약했고, 대형 정육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고기 대부분이 공장식 비육장에서 자라게 됐다. 처음에는 장점도 있었지만, 끝을 모르는 욕심에 지금은 단점으로 가득 찬 괴물로 변했다.
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은 스트레스 탓에 이상행동을 보인다. 돼지는 자신의 앞을 막은 철제 우리를 피 칠갑할 때까지 물어뜯는다. 어릴 때 이를 다 뽑혔지만 잇몸이 으깨져라 철제우리를 씹어댄다. A4용지 한 장만한 공간이 전부인 닭은 서로를 짓밟고 쪼아대기 바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반쯤 잘라버리지만 큰 효과는 없다. 몸뚱이를 비비다가 내장이 보일 때까지 물어뜯거나 깔아뭉개서 죽는 닭도 부지기수다. ‘사육 윤리’라든가 ‘동물의 권리’ 같은 것은 경제적 효율성 앞에 발붙일 데가 없다.
건강도 나쁘다. 쉴새 없이 우유를 짜는 통에 젖소의 젖은 성할 날이 없다. 염증으로 곪아터지거나, 유방암에 걸려도 착유는 계속된다. 고름과 피가 섞인 우유는 살균과정을 거쳐 슈퍼마켓에 진열된다. 눈이 멀거나 암 덩어리를 달고 있는 닭이 낳은 달걀도 시장에 내다 팔린다. 소도 좁은 공간에 갇혀 다리 쓰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관절은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 절뚝이거나 걷지 못한다. 해마다 미국 젖소 100마리 당 35~56마리가 절뚝거리며 걷는 ‘파행’(跛行)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 한 마리는 일년에 1톤 가까운 엄청난 똥오줌을 배출한다. 사료를 통해 섭취한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배설물과 함께 땅이나 하천으로 흘러 든다. 부영양화 현상으로 ‘피스테리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적조생물은 사람의 피부를 녹일 수 있는 맹독성 기체를 내뿜는다. 항생제 남용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슈퍼버그가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축산업계는 공장식 비육장에서 기르는 것보다 자연에서 방목하는 게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스콘신대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사육시설은 기계와 사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방목 농장을 운영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 적고 수익도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수명에 처참한 최후
자연상태에서 사는 돼지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원래 돼지는 15년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자라는 돼지는 고작 5개월 만에 도살된다. 소도 20년 가까이 살 수 있지만 5년이면 도살장으로 끌려 간다. 닭은 자연상태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지만 고기용으로 키우는 육계는 고작 45일이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고기덩어리로 변신한다.
짧은 수명을 다하는 날도 처참하기 짝이 없다. 소나 돼지는 전기쇼크로 실신시키지만, 닭은 뒷다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묶여 거꾸로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간다. 피를 빼기 위해 동맥을 자르면 몸을 버둥거리며 의식을 잃는데 털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담는 순간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저자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바꾸는 것이 좀 더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며 그러려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의 생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기능성식품을 사기 위해 청정지역 연어로 만든 오메가-3나, 하나라도 빠진 게 없는 종합비타민을 사기 위해 꼼꼼히 비교하면서 막상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에 대해서는 무지할까? 그저 한국에서 나면 다 한우니 좋은 거고, 청정지역에서 자란 연어면 다 좋을 걸까? 그건 착각이다.
한우라도 미국과 똑같이 철제 우리에 갇혀 사육된 소도 있고, 호르몬과 항생제 범벅이 된 사료를 먹고 자란 연어도 있다. 다만 포장되는 말이 거창할 뿐이다.
고기 살 땐 가축이 자란 환경 따져봐야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마켓에서 무기력하게 쇼핑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전통식 농장과 목장에서 키운 먹거리를 찾으려면 탐험가나 수사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찾아 다니며 그 먹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니먼은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기왕이면 우리 몸에 흡수될 먹거리가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는 채식주의자지만 가족을 위해 고기를 살 때는 인도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나 농부의 직거래 장터를 찾는다. 가까운 곳에서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귀찮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을 결정한다는 말을 떠올리면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해보자. 어디에서 어떤 길을 거쳐 상에 오르게 됐는지 알아보는 정도는 몸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돼지가 사는 공장>은 ‘돼지가 돼지로 살 수 있고, 닭이 닭으로 살 수 있으며, 소가 소로 살 수 있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식생활을 돌이켜보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 이 기사가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