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특강] 이샘물 동아일보 뉴스이노베이션팀장
‘짙은 눈매, 촉촉한 입술, 잘 정돈된 색색의 머리. 언제 어디서 봐도 팬들에게 완벽한 아이돌이 되기 위해 매일 새벽 거울 앞에 앉는다.’ 기사를 클릭했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은 검은 화면에 띄운 두 문장. 스크롤을 내리면 열다섯 장의 사진이 잇달아 떠오르며 눈길을 붙든다. 미용실 거울 앞에서 머리와 얼굴 손질을 받고 있는 풋풋한 청년들의 모습. ‘내 주머니 속 아이돌’이라는 기사 제목은 그다음에야 등장한다.
케이팝(K-Pop) 아이돌 그룹의 흥망성쇠와 뒷이야기를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이 기사는 지난 7월 21일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보도했다. 이 팀은 지난해 2월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저널리즘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출범시켰다.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저널리즘의 본령에 충실하면서도 그래픽,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을 결합해 독자의 마음을 붙잡는 기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지금까지 나온 연재물 세 편 중 첫 번째인 <증발>은 2020년 한국디지털저널리즘어워드 대상에 선정됐고, 두 번째 <환생>은 2021년 관훈언론상 저널리즘혁신부문상을 받았다.
이샘물(34) 기자는 <증발> <환생> <한국산 아이돌> 등 세 연재물에 모두 기획자로 참여했다. 그는 ‘과학자 같은 검증과 예술가 같은 창의성을 더했을 때 탁월한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6월부터 <동아일보> 뉴스이노베이션팀을 이끌고 있는 그가 지난 10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정통 신문 뉴스룸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하고 구현하기’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읽기를 넘어선 ‘경험’, 기사가 아닌 ‘스토리’

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정책부, 산업부에서 일하던 그는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 저널리즘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취재한 내용을 신문 지면에 글로 옮기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과 갈증이 쌓였기 때문이다. 뉴스룸 밖에서는 이미 블로거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여러 장비를 동원해 글을 넘어선 멀티미디어로 현장을 전달하고 있었다.
석사과정을 밟은 저널리즘스쿨에서는 기사를 ‘작품’으로 여겼다. 독자에게 오래 기억되려면 기사를 넘어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경쟁 상대는 다른 언론사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을 만드는 콘텐츠 회사들이라고 배웠다. 좋은 기사를 열심히 써내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독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알아야 했다.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은 독자의 관심이 작품에 오래 머물도록 기사의 모든 영역을 챙겼다. 그 영역은 ‘멀티미디어 스토리’였다.
2019년 귀국한 그는 이듬해 히어로콘텐츠팀에 기획자로 참여했다. 이 기자는 히어로콘텐츠를 ‘멀티미디어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스토리를 중심에 둔 디지털 기사’라고 소개했다. 그래픽과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에 실명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녹였다. 단순한 ‘읽기’가 아닌 ‘경험’을 주는 것, 텍스트(글)로 전하지 못하는 감각을 다른 매체를 통해 느끼게 하는 것을 추구했다.
“히어로콘텐츠팀에서 만드는 이야기는 독자에게 인상 깊은 경험으로 다가가 잊히지 않는 작품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자가 기사를 어떻게 소비하고 경험하는지 그 방식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독자가 웹, 지면, 잡지 등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만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정보를 순서대로 전달하는 신문과 스크롤을 통해 텍스트와 미디어를 쓸어 넘기는 웹에서 기사는 다르게 읽히죠.”
이 기자는 “플랫폼에 따라 기사의 작법이나 형식은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갖고 기사를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 도화지에 차별화한 콘텐츠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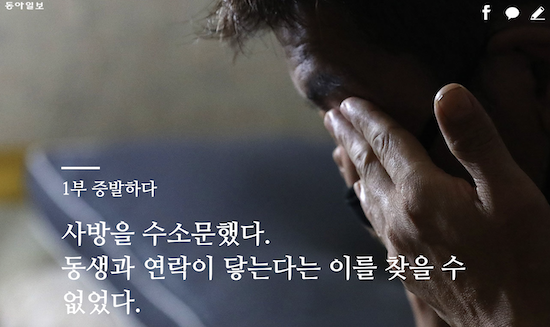
지면을 벗어난 상상력을 펼치려면 새로운 문법을 담아낼 공간이 필요했다. 신문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로는 부족했다. 빈 도화지를 찾았다. <동아일보> 사이트와 별도로 ‘디 오리지널’(The Original) 페이지를 마련했다. 그래픽과 일러스트(삽화), 영상 등을 기사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히어로콘텐츠팀은 차별화한 기사를 지향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없었던 단독 기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기자는 설명했다. 과거에 보도된 소재도 전달 방식이 달라지면 새롭게 읽힌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도한 <증발>은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세상과 단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다. <증발>의 차별점은 실종 통계나 가출 사연을 전달하는 대신 ‘증발’을 열쇳말 삼아 스스로 사라진 이들의 사연을 사회 현상으로 풀이한 데 있다. 72년생 중년 남성의 자발적 단절, 세상과 연결을 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래고시텔, 남겨진 가족의 슬픔 등 여러 각도에서 현상을 다루며 만화 같은 일러스트와 강렬한 사진을 엮었다.
지난 2월 보도된 두 번째 시리즈 <환생>은 7회에 걸쳐 장기기증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추락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심장과 신장을 기증하고 떠나는 아들을 병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 어떤 문장을 이어붙여도 그 슬픔을 독자에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환생>은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영상에 담아 그 절절함이 보는 이의 피부에 와닿게 했다.
세 번째 시리즈 <한국산 아이돌>은 신문 기사의 작법을 의도적으로 벗어났다. 제목을 뒤로 돌리고, 분장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느닷없이 보여주었다.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티저’ 영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지면에서 할 수 없는 시도들을 했다. 케이팝 아이돌이라는 익숙한 소재에 다르게 접근하면서, 깊숙이 취재한 그들의 고된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기자는 세 편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이 ‘스토리’라고 했다. 정보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니, 소구력이 높았다고 말했다. <한국산 아이돌> 시리즈를 읽은 해외 독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기사를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신문 기자’ ‘방송 기자’를 따지지 않는 시대

이 기자가 미국에서 저널리즘스쿨에 다닐 때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특정 플랫폼과 관련지어 언론인을 지망하지 않았다. 대신 라이터(Writer), 포토그래퍼(Photographer), 영상 저널리스트 등 직군으로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어떤 플랫폼에서도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코딩, 영상 편집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
이 기자는 플랫폼에 따라 언론인이 하는 일을 규정해서는 독자에게 닿는 새로운 언어를 실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새로운 실험을 통해 언론의 미래를 주도해가려면 직군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배워야 어떻게 기사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널리스트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은 변한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생 조한주(28) 씨는 “독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저널리즘의 본령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매몰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독자를 고려해서 무엇을 취재할지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도할지를 독자를 생각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달력 측면에서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이는 현직 언론인을 초청해 ‘저널리즘 특강’을 열고 있다. 초청 강사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지형과 언론의 대응, 언론인의 고민 등에 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한다. <단비뉴스>는 강연과 문답 내용을 기사와 영상으로 독자들에게 배달한다. (편집자 주) |
편집: 신현우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