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흔든 책] 경계를 넘는 기자들
경계를 넘는 기자들/이샘물 지음/이담북스/1만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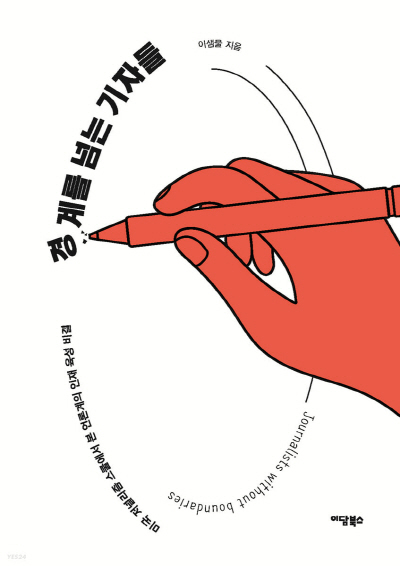
흔히 ‘언론 고시’라 불리는 언론사 입사 시험을 위해 출간된 수많은 수험서가 있다. 시사상식 시험 준비, 글쓰기 시험 준비 등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이런 책을 아무리 읽어도 언론계 현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입사 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또 어떤 태도로 그 삶에 임해야 하는지 물을 곳은 정작 마땅치 않다. <경계를 넘는 기자들>은 그 미지의 영역을 파헤친다.
저자 이샘물 기자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10년 뒤 한국 언론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은 그를 답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서른 살에 6년 차 기자였던 이샘물 기자는 숲 밖으로 나가 숲을 보고자 미국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 입학을 결심했다.
이 책은 프로페셔널 정신을 가르치는 미국 저널리즘스쿨의 인재 육성 비결을 다룬다. 기자 지망생뿐만 아니라 이미 기자로 살다가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온 이샘물 기자의 도전기를 담아냈다.
아마추어의 울타리를 넘어 프로의 세계로
‘저는 기자가 아닌 것으로 제 스스로를 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이 제출하는 명예 서약서의 마지막 문장이다. 학교에 소속돼 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학생보다 기자로 인식할 것을 맹세하는 대목이다. 뉴욕대 저널리즘스쿨 학생 핸드북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부터 취재 과정에서 겸비해야 하는 윤리 의식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학생들은 저널리즘스쿨이 운영하는 매체 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외부 주요 언론사에 기사를 발간할 각오로 취재에 임할 것을 요구받는다.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드넓은 캘리포니아 땅을 거침없이 누비는 것은 물론, 해외 취재를 위해 학교의 지원을 받아 국경을 넘기도 한다. 학점 취득을 위해 과제를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세계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기사를 만들어낸다.
그 품질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이 보도하는 국제 뉴스다. 체계적으로 구성한 취재 프로젝트 제안서를 학교 측에 제출해 경비 지원을 받은 한 학생이 케냐 북부 지역 여성들의 성 착취 문제를 취재한 사례가 책에 등장한다.
국제 뉴스를 가르치고 지원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이상을 상징한다. 이것은 기자라면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고 누벼야 한다는, 사고와 업무의 ’범위‘를 의미한다. (중략) 저널리즘스쿨에서 학생들의 취재엔 국경도 한계도 없다. 오로지 최고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경계를 넘는 기자들>, 61쪽)
아늑한 곳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은 우리는 대개 편하고 익숙한 일을 도맡아 하곤 한다. 비판과 실패의 쓴맛을 맛보는 것보다는 그나마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일을 택하는 편이 심리적 안정에 훨씬 도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저널리즘스쿨에서 이샘물 기자는 ‘낯설고 힘든 일’에 떠밀렸다. 발생 기사를 포함해 프로파일이나 해설 등 여러 형식의 기사를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다. 더불어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보도까지 요구받았다. ‘안 배울 선택권’을 주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인해 저자는 비로소 편안한 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일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코딩 지식을 적용해 데이터 저널리즘을 배운다.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는 입학 초부터 다양한 작업을 과제로 제시한다.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하던 일부 학생들도 “이제 와 돌아보니 배우길 잘했다”고 말한다고 저자는 적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겸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저널리스트의 필수 덕목이기 때문이다.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보도의 사례 가운데는 마약에 중독된 노숙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겪는 고충을 담은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동시에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약에 취한 노숙 여성의 목소리가 이내 울음과 섞인다.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가슴을 후빈다. 집중과 노력을 요하는 긴 글 형식에서 벗어나 독자를 온전히 기사에 몰입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다양한 형식과 실험으로 독자를 몰입시키다
이샘물 기자는 ‘읽히지 않는 기사’를 생산하는 일에 회의를 느꼈다. 미국 저널리즘스쿨에서는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오늘날의 독자들에 맞게 저널리즘 구현 방식의 진화를 고민한다. 디지털 세대의 독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파악해 그에 맞는 제작 및 유통 전략을 세우는 ‘플랫폼 지능’(Platform Intelligence)이 이제는 필수라고 설명한다.
가령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모바일 뉴스 앱을 직접 만들거나 2025년을 가정한 뉴스 지형의 미래 시나리오 등을 만들어봐야 했다. 한국에서는 앱을 만드는 것이 기술자의 영역으로 간주되지만, 미국 저널리즘스쿨에서는 모든 기자의 도전 영역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기자의 전통적인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저널리즘스쿨에서는 모두가 기자인 동시에, 독자 분석 전략가가 됐다. 독자의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민하며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계의 ’이용자 연구‘와 유사했다. 어떤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용할지를 파악하듯이 독자들이 기사의 어디를 보고 활발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경계를 넘는 기자들>, 166쪽)
이샘물 기자는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동아일보>로 복직했다. 현재는 뉴스이노베이션팀장으로서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에 땀을 쏟고 있다. 미국 저널리즘스쿨의 정신을 벤치마킹해 틀에 박힌 한국 언론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낯설고 어려운 길 끝마다 반짝이는 저널리즘의 미래에 관한 해답을 발견하겠다는 그의 결심이 그 모든 일의 원동력일 것이다.
편집: 현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