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찬 칼럼] 독자와 기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얼마 전, <뉴스 탁월성 지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탈고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되어 두루 공개됐다. 박재영 고려대 교수, 김창숙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원과 함께 조사하고 집필했다. 더 보완하여 일련의 연구논문으로 발표할 무렵에 상세 내용을 적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부만 소개한다.
연구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좋은 기사를 평가하는 독자의 기준’이었다. 그 기준을 ‘규범의 필터 버블’ 바깥에서 찾고 싶었다.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해달라고 독자에게 주문하고, 독자가 이를 낮게 평가하면 ‘공정성을 더 강화하라’고 기자에게 주문하는 쳇바퀴를 벗어나고 싶었다. 있는 그대로의 독자의 감각에 천착하고 싶었다.
두 학기에 걸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그리고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생들에게 1주일에 1건씩 4주 동안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기사’를 고르고 ‘왜 좋은 기사라고 판단했는지’ 적은 비평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368개 기사에 대한 A4 용지 320여 장에 이르는 비평문을 분석하며, 우리는 놀랐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독자의 잣대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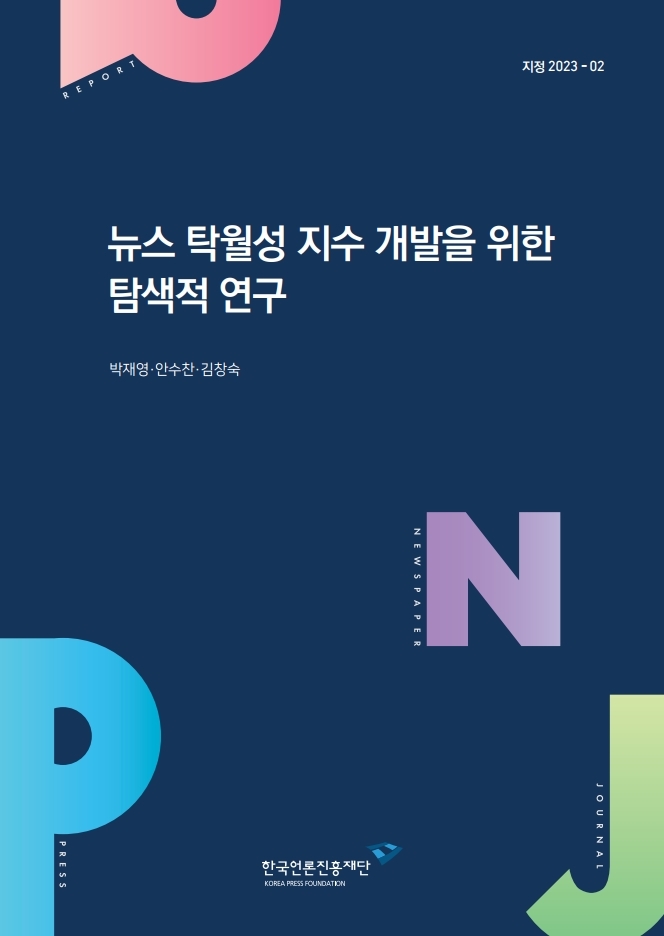
첫째, 독자는 기사를 읽으면서 취재 수준부터 평가했다. 특히 ‘끈질긴’, ‘용감한’, ‘치열한’, ‘고생한’, ‘발품을 판’ 취재를 높게 평가했다. 비유하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요리 과정을 확인하려고 주방부터 살펴보는 식이었다.
기자들로선 무서운 일이다. 기사 내용에 앞서 기자의 취재 실력부터 독자가 평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독자 평가문 가운데 ‘직접 취재하여 좋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점도 이채로웠다. 직접 사람을 만났거나, 직접 문서를 분석했거나, 직접 현장을 찾아간 기사를 독자는 신뢰했다. 이는 좀 안쓰러운 일이다. 받아쓰고 베껴 쓴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직접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독자는 그 기사를 칭찬했다.
둘째, 독자는 교감하게 만드는 기사를 좋아했다. ‘아팠다’, ‘분노했다’, ‘안타까웠다’, ‘시원했다’, ‘따뜻했다’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기사로 평가했다는 독자가 많았다. 특히 ‘내 일처럼 느꼈다’, ‘내 이야기 같아서 공감했다’는 표현이 많았다.
그런 평가를 받은 기사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는 이른바 ‘최루성 기사’가 아니었다. 독자가 가장 좋은 기사로 골라낸 것은 이슈나 인물에 몰입하면서 희로애락의 다양한 측면을 깊은 수준에서 느끼게 만드는 보도였다. 독자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기사에 감정적으로 밀착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의 고양을 느낄 때 정말 좋은 기사라고 평가한다는 점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셋째, 독자는 지식과 이해를 높여주는 기사를 좋아했다. 여러 평가문 가운데 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몰랐던/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 ‘의문을 해소했다’, ‘똑똑해졌다’ 등 이해의 수준을 높여준 기사를 독자는 높게 평가했다. 또한 ‘나를 돌아보게 됐다’, ‘생각/고민하게 됐다’, ‘반성/성찰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등 성찰과 관련한 평가문도 많았다. 좋은 기사는 세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독자가 기사에서 얻는 효능의 실체인 것이다.
독자의 비평 가운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존경스럽다’거나 ‘이런 기사라면 매일 찾아서 읽겠다’는 문장도 있었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평가할 준비를 갖췄고, 기자가 독자로부터 존중받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는 기뻤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여전히 기자는 기사를 통해 세상에 이롭고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기자가 할 일을 조금 정돈하여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용감하게, 열심히, 발품 팔아 취재해야 한다. 부실한 취재를 독자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둘째, 독자가 몰입하여 교감할 수 있도록 기사의 구성, 문장, 편집을 다듬어야 한다. 열심히 취재한 기사일수록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어렵고 불친절한 기사를 억지로 읽어주는 독자는 이 세상에 없다. 셋째, 그 기사에 삶, 사회, 세계, 공동체의 새로운 면모를 담아야 한다.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야, 독자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사와 매체를 다시 찾아온다.
이 과정을 거쳐, 읽을 때마다 기사의 효험을 느끼게 만드는 기자가 있다면, 독자는 그 기자를 비로소 인지하고, 평가한다. 그 경험이 쌓이면, 그 기자를 좋아하게 된다. 드물게는 존경의 마음도 품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기사는 독자와 기자를 두루 행복하게 만든다.
*이 글은 <미디어오늘> 11월13일 자 ‘사실과 의견’ 코너에 실렸던 것을 신문사의 허락을 얻어 일부 수정해 전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