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추천 좋은 기사] 2021년 퓰리처상 해설 보도 수상작 – 면책특권 로이터 보도
퓰리처상은 탐사보도와 지역 보도, 사진 보도 등 저널리즘 15개 분야에 수여된다. 이 가운데 ‘해설 보도’(explanatory report)는 일반시민이 사회 의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 사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해석 저널리즘’(interpretive journalism)과는 구분된다. 해석 저널리즘은 몇몇 사실의 관계로부터 의미를 추론하는 것에 비해, 해설 보도는 오직 방대한 사실을 다루는 것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설 보도는 복잡한 현안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 주제를 뒷받침하는 인터뷰와 다양한 사례를 무기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로이터>의 미국 경찰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을 다룬 연속보도 ‘쉴디드’(Shielded)는 돋보이는 해설 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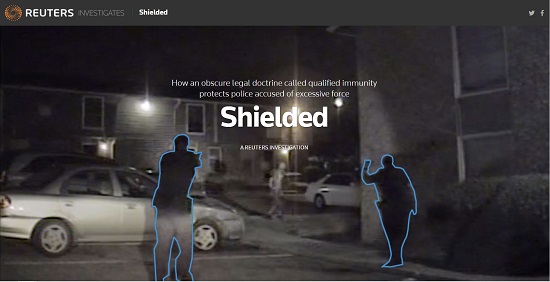
데이터가 보여준 ‘경찰 편향’ 판결
앤드루 청(Andrew Chung) <로이터> 기자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고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면책특권을 분석했다. 면책특권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며, 왜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미국에서 경찰관의 과잉 진압은 일상적인 문제다. 2020년 5월에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지는 영상이 SNS로 번지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행인이 찍은 영상에는 경찰이 수갑을 찬 플로이드의 목을 8분 동안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엎드린 채 짓눌린 플로이드는 “숨을 못 쉬겠다”고 10번 넘게 말한 뒤 숨졌다.
가해자인 경찰관 데릭 쇼빈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공무 수행을 하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고,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면책특권을 분석한 시리즈 기사 네 편 가운데 첫 기사를 2020년 5월 8일 내보냈다. 공교롭게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나기 10여 일 전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면책특권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두 단계의 판단을 거친다.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 압수를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해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가 첫 번째 단계다. 문제가 된 진압 행동이 ‘명백히 확립된’(clearly established) 판례와 매우 유사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인지했는지가 두 번째 단계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할 때만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묻는다.
앤드루를 중심으로 한 <로이터> 보도팀은 판례를 분석했다. 2015년부터 기사가 작성된 전년인 2019년까지 252건을 훑어 판결 이유를 확인했다. 첫 번째 판단 단계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많았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과도한 물리력을 썼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와 유사하지 않고, 경찰관 본인도 법 위반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005년부터 2년 동안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비율은 44%였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은 57%가 됐다. 2009년부터 대법원이 두 가지 판단 단계 가운데 물리력이 과도했는지를 묻는 첫 번째 단계는 생략해도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 생긴 경향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대법원이 만든 ‘폐쇄 고리’
3개월 만에 후속 기사를 내놓은 <로이터>는 한 발 나아갔다. 공권력에 우호적인 지역일수록 경찰에 편향된 판결을 내린 비율이 높다고 밝혀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중부와 남부는 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텍사스주에서 면책특권을 인정해준 비율은 59%로, 서부 캘리포니아주 34%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일관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신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과잉 진압 피해자의 무기 소지 여부에 따라서도 지역별 면책특권 인정 비율은 극명하게 달라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진압 대상이 무기를 들고 있었더라도 경찰이 총을 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비율이 67%였는데, 반대로 텍사스에서는 무기가 없는 사람을 진압했는데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비율이 65%였다.

<로이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로이터>는 예시를 든다. 2011년 오클라호마주 한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30대 남성 레이자의 이야기다. 병실에 있기 싫다며 병동을 돌아다닌 레이자는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붙잡혔다. 경찰들은 레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갑을 채우고 등 뒤로 올라탔다. 폐렴 환자인 레이자는 호흡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하급심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해 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진압하다 숨지게 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지 판단한 똑같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모호한 상황은 다양한데, 명백하게 정립된 판례는 제한적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용의자와 경찰관 사이 거리,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소리 지르는 내용까지 조금이라도 선례와 다르면 적용 가능한 판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하급심 판사들을 인터뷰해 대법원의 이런 태도를 ‘마지못해’(with reluctant) 따르고 있다는 내용까지 기사에 담았다.
어느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판례가 얼어붙었다”(The case law gets frozen)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판례 적용이 너무 엄격해 새로운 판례가 도저히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이런 상황을 ‘폐쇄된 고리’(Closed loop)라고 적었다. 이 기사의 제목 ‘Shielded’는 경찰이 아무리 과도하게 진압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함의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연방대법관 9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누구도 무기는 없었다, 다만 모두 흑인이었다
대법원의 이런 면책특권 원칙은 1967년 만들어졌다. 남북전쟁 이후 극심한 사회갈등이 된 인종차별이 출발점이다. 당시 흑인 린치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는데도 경찰이 방관하거나 오히려 가담하는 일이 생기자 의회는 1871년 ‘쿠 클럭스 클랜 법’을 만든다. 일반시민이 민권침해를 당했다면 경찰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법이다.
100년이 지나 민권운동이 성장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흑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법정에 세웠다. 그러자 1967년 의회는 판례를 만들었다. 용의자를 진압해야 할 때는 무력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할지 대체로 모호한데, 이때는 경찰관 스스로 위법하다고 인지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되도록 경찰관의 책임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면책특권 문제는 아직도 흑인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 <로이터>는 세 이야기를 소개한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자다가 ‘웬 으스스한 차가 보인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총을 맞고 숨진 흑인, 자전거를 타고 우연히 절도 현장을 지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흑인, 열쇠를 잃어버린 채 자기 집 앞을 서성이다 순찰 중인 경찰에 목과 몸통을 가격당한 흑인 이야기다.
<로이터>는 해당 경찰관들을 찾아내 인터뷰했다. 모두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3명은) 누구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흑인이었다”(None were armed. All were Black)며 과잉 진압을 부른 건 인종에 대한 경찰의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에게 필요한 해설 보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가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살해될 확률은 백인 남성의 2.5배였다. <로이터>가 분석한 자료에도 피해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 경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 흑인이 피해자인 비율은 22%였다. 미국 인구 구성상 흑인 비율(10%)의 두 배가량이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탐문 중인 경찰이 가정집을 찾아갔다가 집주인이 총을 들고 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숨지게 해도, 경찰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현실을 <로이터>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국민이 무기를 가지고 다닐 기본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부정하고 경찰에게만 권리를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다.
<로이터> 해설 보도는 면책특권을 보는 관점을 넓혀 기본권과 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 방향을 보여준다. 기본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 못지않게 경찰권을 향한 호의도 법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판례법은 ‘폐쇄된 고리’를 맴돌고 있다. 경찰의 면책특권은 ‘일단 쏘고 보자’(Shoot first and think later)는 직업 관행으로 변질됐고, 그 주요 피해자는 흑인이다. <로이터>는 이 모든 논증을 데이터 분석, 의혹 당사자에 대한 끈질긴 인터뷰, 사안의 핵심을 담은 사례 발굴 등 저널리즘의 기본적 취재 방법으로 촘촘하게 풀어냈다. 해설 보도의 탁월한 성과다.

* 기사 원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상에는 좋은 기사들이 있다. 저널리즘의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다. 언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여전히 언론에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기사이기도 하다. 기자는 그런 기사를 꿈꾸고, 독자는 그런 기사를 기다린다. <단비뉴스>는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주요 기자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기자와 독자에게 두루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기사를 골라 소개한다. (편집자주) |
편집: 남윤희 기자
단비뉴스 지역사회부, 편집기획팀 박성동입니다.
"의견은 흔하지만 사실은 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