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사전] ‘인공지능’

전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숫자를 세는 방법은 같다. 십진법이라는 만국 공통의 숫자 체계는 우리가 지구촌 어느 낯선 땅을 여행하더라도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십진법도 만능은 아니다. 시간과 날짜를 셀 때는 60진법에 12진법도 쓰인다. 언뜻 낯설지만, 우리 삶에 익숙한 이 셈법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서도 점성술에 뿌리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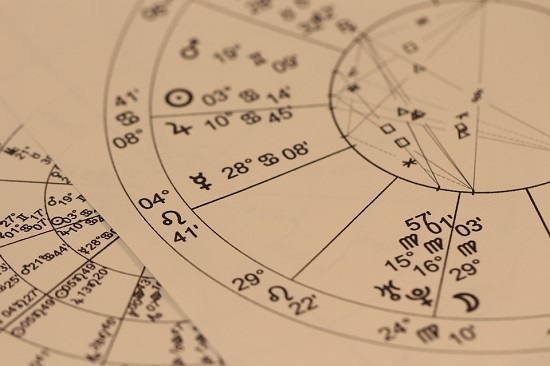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은 신이 자기 의지를 자연현상에 숨겨뒀다고 믿었다. 해와 달, 별이 뜨고 지거나 일식과 월식은 물론 해무리, 달무리, 별똥별... 온갖 천문현상을 단순하게 지나치지 않았다. 그 속에 신의 의지가 담겼다고 봤다. 심지어 양의 내장이 뒤틀린 정도에서도 신의 의지를 찾았다. 자연현상을 수십, 수백 년 관찰한 결과는 쐐기문자 점토판이나 조각으로 남았다. 이런 경험적 통계는 특정 자연현상이 길조인지 흉조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됐다. 관찰의 결과물은 단순한 점성술에서 천문학으로 발달했다. 재현 또는 예측 가능한 과학의 탄생한 것이다. 신의 뜻을 샤먼(Shaman)이 전달한다고 믿었던 문명권과 달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과학적으로 앞선 성과를 일궈낸 비결은 ‘관찰’에 있었다.
관찰한 현상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은 과학 발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관찰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사유’로 이어질 때 빛을 발한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수많은 사람이 관찰했지만, 왜 떨어지는지를 깊이 사유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낸다. 인간은 추론으로 깊어진 사유를 통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충족하며 ‘과학’을 발전시켜왔다.
사유를 통한 인간 지능 발전과 과학의 발전은 함수관계임을 인류역사가 증명한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사유 기능이 생략된 ‘지능’을 창조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지능으로 불가능한 계산과 업무처리를 해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혁명에 내린 정의, 곧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기 무덤을 파는 일꾼을 생산하는 셈’이라는 냉소가 떠오른다. 섣부른 낙관 전에 우리의 과학 또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인공지능의 정보처리 과정은 인간과 다르다. 그 알고리즘은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해 결과를 낸다. 인간은 여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지적 능력을 잃는다. 가설과 추론이라는 검증 과정은 사라지고 빅데이터가 그 자리를 메운다. 미래학자이자 작가인 니콜라스 카는 <유리감옥>에서 이 문제를 통찰했다. ‘예측 알고리즘은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 특성과 현상이 생기는 근본 원인에는 무관심하다.’ 인공지능이 각광받는 과학의 시대, 인간은 어쩌면 호기심과 사유를 가로막는 ‘새로운 샤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 보들레르가 ‘모든 능력들의 여왕'이라고 말한 상상력이 학문 수련 과정에서 감퇴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널리즘은 아카데미즘과 예술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옥죄는 논리의 틀이나 주장의 강박감도 벗어 던지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상상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튜토리얼(Tutorial) 과정에서 제시어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상상 사전’이 점점 두터워질 겁니다. (이봉수) |
편집 : 박선영 기자







